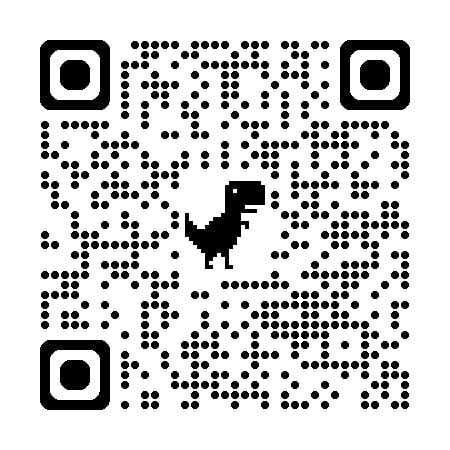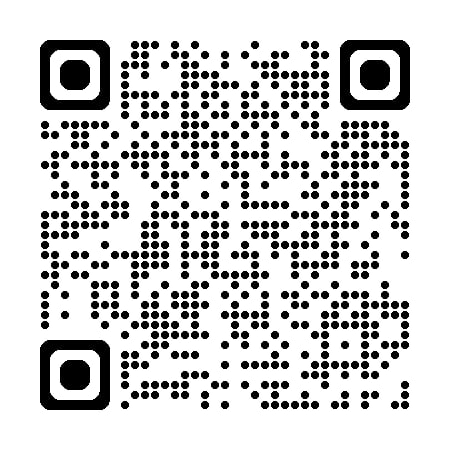"공포의 보수" – 프랑스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2025년 8월 8일 / 한마디의 세상 Word of the World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해져야만 한다”(To be free in this world, we must be feared. To be feared, we must be powerful.)
–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 7월 14일 바스띠유 기념일을 맞아 프랑스는 향후 2년간 65억 유로의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마크롱의 발언은 요즘 ‘잘 나가는’ 무기회사인 Palantir의 CEO인 알렉스 카프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최근 이렇게 비슷한 발언을 했다: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은 적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Palantir의 주요 사업 실험장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이며, 그들은 가자 지구 주민들의 영혼에 공포를 심기 위해 역사책에 나오는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수단들은 바로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했던 것들이다.
이는 가자 지구의 문제가 유태인 대 반 유태인, 시온주의 대 반 시온주의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히틀러의 인종청소, 홀로코스트는 유태인에게 한정된, 즉 특정적인 것이 아니다.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공포를 주입하고 더 강해져야한다는 논리는 단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공포(terror)의 정치’이다.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히틀러의 역사적인 유산을 가장 실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타인의 공포 위에 기초한 자유는 근대 이전의, 노예 시대의 정치 철학이었다. 심지어는 민주정을 표방한 아테네는 노예는 원했을지언정 노예의 공포에 기초한 자유는 원하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예들을 살해하던 ‘Crypteia’라고 불리는 Death Squad를 운용한 스파르타의 통치 이념이 바로 ‘공포에 기초한 (지배자의) 자유’였으며, 역사상 모든 전제정치는 공포에 기초하고 있었다.
마크롱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분명치는 않다.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 사헬지구 국가들이 200여 년간 주둔해왔던 프랑스군의 철군을 요구하며 식민지 청산 운동을 하는데 대해 별다른 대항 수단이 없어서 프랑스 제국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속옷까지 다 벗어주게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미국-EU 관세 협정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국가가 프랑스다), 러시아의 푸틴에게서 마크롱이 찬밥신세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마크롱은 프랑스가 바스띠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1789년 프랑스 시위대가 바스띠유 감옥을 습격한 뒤 수비대장과 파리시장을 참수하고 창에 걸어 효수한 장면을 그린 판화
1789년 프랑스 시위대가 바스띠유 감옥을 습격한 뒤 수비대장과 파리시장을 참수하고 창에 걸어 효수한 장면을 그린 판화
더욱 아연한 것은, 프랑스의 이른바 ‘좌파’들이 지난 24년 총선에서 마리 르뺑의 ‘인민전선’을 막기 위해 마크롱이 만든 정당인 ‘르네상스’와 ‘선거연합’(이른바 ring fence)을 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인민전선은 기껏해야 근대적 짝퉁 파시스트이지만, ‘공포에 기초한 자유’를 부르짖는 마크롱은 근대 이전의 봉건 전제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히틀러를 저지하기 위해 루이14세와 손을 잡는다는 정치세력이 좌파로 군림하는 한, 자본주의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 <공포의 보수(The Wages of Fear)>는 프랑스의 앙리-조르주 클루조 감독이 만들고 이브 몽땅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로, 1953년 칸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 동시 대상 수상작이다. 한국에서는 영화의 결말을 못마땅해한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로 결말이 통째로 달라질 뻔 했었다.
demlabor1848@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